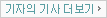등산로와 자전거길 구분해 마찰 줄인 곳도 있어
봄이 되며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도시 근교 산의 탐방로는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이 돌아왔다. 그런데 매년 이 즈음 산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논란이 있다. 좁은 산길에서 도보 등산객과 산악자전거를 타는 라이더 사이의 실랑이가 바로 그것.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라이더 사이의 마찰은 도시 근교의 낮은 산에서 잦은 편이다. 이런 곳은 많은 사람으로 붐비기 때문에 그만큼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속도를 내는 일부 산악자전거 라이더와 등산객이 충돌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근교 산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서울 망우산과 안산, 성남 남한산성 등 수도권의 산에서 만난 등산객들은 “산행 중에 자전거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며 “사람이 별로 없을 때야 자전거가 다녀도 큰 상관없겠다 싶지만, 주말에 등산로가 복잡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위협을 느꼈다는 한 등산객은 “벨을 울리며 내려오는데도 못 알아차려 다가오는 순간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다”며 “바로 옆이 낭떠러지였는데 너무 위험했다”면서 자전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

- ▲ 군포 수리산은 임도를 산악자전거 코스로 지정해 등산객과 마찰을 줄였다.
사실 산에서 등산객이 자전거를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완만한 평지에서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특히 주의가 분산되는 비탈길 구간은 위험이 크다. 대부분의 등산객은 오르막 구간에서 땅을 보며 걷는 경우가 많고, 모자를 쓰고 있으면 시야가 가려 위쪽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하산하는 사람 뒤에서 산악자전거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오로지 청각으로만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어폰을 끼거나 크게 음악을 틀며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더욱 인지하기 어렵다.
산에서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하면 중상을 입는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비탈진 곳에서는 사고자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2차사고까지 우려된다. 강변도로와 같은 평지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다.
산에서 속도를 내며 달리는 자전거가 위험한 것은 산악자전거 이용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들도 사고가 나면 몸을 다치고 피해를 입는 것은 등산객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동호인들 나름대로 원칙을 공유하며 등산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망우산에서 만난 MTB 동호회원은 “산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을 피하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으며, 등산객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하는 것을 매너로 알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속도를 내며 등산객을 위협하는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등산객 가운데는 ‘산길에 자전거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다. 하지만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실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악자전거는 동력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등산로와 레저스포츠 길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그 기준이 용도의 구분에 국한될 뿐 처벌이나 제한 규정은 없다.
-

- ▲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라이더.
문제는 산길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등산객이 몰리는 산길에 자전거가 무리지어 다니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내리막을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전거의 산길 통행을 통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법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올바른 산악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탈길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고 사람이 많은 길을 피하도록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경기도 군포 수리산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산악자전거 코스와 산행 코스를 구분해 운영하며 등산객과 라이더 간의 마찰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수원 백운산에서는 산악자전거 동호인들과 지자체가 협의해 등산로와 산악자전거 코스를 구분해서 운영하기도 했다.
아예 길을 나눠 놓으니 자전거와 등산객이 분리되며 자연스럽게 마찰이 줄어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등산객과 동호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경기도 모 지자체의 산림공원 담당자는 “자전거는 도로에서 약자지만 등산로에서는 강자”라며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산에서 만나는 등산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